
“지티비코리아의 이익보다 사업자의 이익을 먼저”

나무나 연탄을 때워 따뜻해진 아랫목에 밥이나 고구마를 넣어놓는 모습은 보일러가 자리 잡은 요새는 찾아보기 힘들다. 현대에는 보일러가 집집마다 들어선 것이 일상적인 풍경이 됐다. 우리에게 추운 겨울마다 온기를 선사해주는 보일러는 온돌에서 이어지며 발전해온 주거 개발의 산물이다. 오랜 역사를 지닌 바닥 난방이 과거에도 널리 쓰였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과는 다르게 시대에 따라 유행을 탔다.
천천히 퍼지는 온기
동아시아 내 가장 오래된 온돌은 북옥저 지역에서 찾을 수 있는데, 기원전 2세기에서 3세기 쯤으로 추정된다. 발견된 유적은 쪽구들(부분 구들) 형식을 하고 있었다. 추운 북부 지역에서 쓰이던 쪽구들 형식은 점차 한반도 남쪽으로 전파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렇게 널리 쓰이지는 못했다.
고구려 초기만하더라도 쪽구들을 쓴 유적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삼국시대 평민 대부분은 찬바람을 막기 위해 반지하 형태로 지은 수혈식 집과 화로를 집 가운데에 들여 추위를 피했다. 고구려인들이 온돌을 만들어 사용한 흔적은 4세기 이후부터 발견되고 있다. 10세기에 쓰여진 중국 당나라 시대의 역사서 <구당서>에 나오는 고구려인들의 주거 문화에 쪽구들이 있다는 대목을 통해 고구려 후기에야 온돌이 널리 쓰였다고 미루어 짐작된다.
비판적인 학자들은 단편적인 기록만으로는 판단 근거가 부족하다 여기기도 한다. 고분 등에서 발견되는 생활상을 그린 벽화에 부엌의 부뚜막만 있고 쪽구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온돌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게다가 귀족이 의자나 평상에 앉아있는 입식생활을 그린 벽화를 볼 때 쪽구들보다는 난로나 화로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고구려에 온돌이 얼마나 널리 쓰였는지는 아직까지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주거 한류의 시작
온돌은 고구려 바깥으로 넘어가 백제와 신라, 그리고 일본까지 전래됐다. 백제와 일본 고대 유적지들에서 쪽구들을 종종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고구려와 백제를 무너뜨리고 시작한 통일신라시대까지도 온돌은 잘 활용되지 못했다. 당시 사람들은 온돌보다는 숯을 지펴서 하는 난방을 선호했다.
반면 고구려 계승을 표방한 발해에서는 온돌이 많이 사용됐다. 발해 유적지에서 많은 관련 유물을 찾아볼 수 있다. 발해가 멸망한 이후에도 발해를 구성했던 한 축인 여진족과 만주족의 후예들은 쪽구들인 ‘캉(炕)’을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1124년 송나라 사람 서긍이 집필한 <고려도경>에는 “침상 앞에는 또 낮은 평상을 놓았는데, 3면에 난간을 세우고 각각에는 무늬있는 비단 보료를 깔았다. 또 커다란 자리를 깔았는데 돗자리가 편안하여 전혀 오랑캐의 풍속이라 느낄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국왕과 귀족의 경우이고, 아울러 중국 사신을 접대할 때의 모습이다. 서민들은 대부분 흙침상으로, 땅을 파서 쪽구들을 만들어 그 위에 눕는다. 이것은 고려가 겨울이 몹시 춥지만 솜과 같은 것이 적기 때문”이라고 묘사돼 있다.
<고려도경>에 그려진 고려의 모습이 꼭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저자인 서긍이 고려의 서울이었던 개경만을 보고 적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 내용을 무조건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근래 대전시 상대동에서 발굴된 고려시대 마을 터에 많은 집터가 있었지만 온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발견된 온돌도 다 쪽구들이었는데, 단 한 집만이 바닥 전체를 데우는 온구들이었다. 고려 중기쯤에 지어진 것으로, 학자들은 이 무렵부터 쪽구들에서 온구들로 전환되기 시작했다고 본다.
왕의 온돌
온돌이 궁궐에 들어온 것은 조선시대부터다. 조선 초기에는 나무로 만들어진 마루를 썼는데, 조선 초기를 배경으로 한 사극에서 궁궐 바닥에 장판이 깔려 있다면 고증이 미흡한 것이다. 온돌이라고는 하나 실제로는 화로를 나무 침상 아래에 놓아두어 따뜻하게 했을 뿐이다.
이러한 형식의 난방은 화재에 매우 취약했다. 명종은 이 때문에 두 번이나 화재를 겪었다. 명종실록에 따르면 명종은 두 번이나 있었던 화재에 대해 “지난 밤 화재가 중하지는 않았으나 전에도 화재를 겪었으므로 약간 놀라기는 했다. 그러나 크게 놀라지는 않았다”고 말했다고 한다.
궁궐에서 온돌은 특별한 목적으로 쓰였다. 세종실록을 보면 성균과 유생들이 장마철로 습진이 생겨 고생을 하던 것을 본 세종 대왕께서는 5간(5평) 정도의 크기로 온돌을 만들어 치료했다고 한다. 태종실록에서도 성균관 유생들을 위해 온돌방을 환자를 위해 마련했다는 비슷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런가하면 연산군은 실내에서 가면극을 볼 수 있도록 방에 온돌을 놓았다고 전해 내려온다.

모두를 따뜻하게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초에 민간에 퍼지기 시작했다. 인조실록이나 현종개수실록에 그 모습을 찾을 수 있다. 민담과 야사(민간에서 저술된 역사)를 모은 <청성잡기>에는 일반 백성들 중에 온구들 형식의 온돌이 널리 쓰이겐 된 것이 김자점에 의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도성 주변에서 산불이 잦자 인조가 대책을 강구하는데, 김자점이 산의 낙엽을 땔감으로 쓰는 온돌을 보급하는 방안을 내렸다고 한다. 야사의 기록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증거로 보기는 어렵지만, 비슷한 시기 선조가 궁궐을 전면적으로 온돌방으로 개조를 했다고 밝히는 것과 시기가 어느 정도 일치한다.
같은 시대에 지방에도 온돌 보급에 대한 기록이 있다. 1560년대 유희춘의 <미암일기>나 임진왜란 때 쓰여진 <쇄미록>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온돌의 확산은 마루방을 온돌방으로 전환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경상북도 상주에 있는 양진당은 1626년 건축 당시에는 마루방이었지만 나중에 온돌방으로 전환한 대표적인 건물이다.
외국의 시선
외국인들에게 온돌은 매우 생소한 것이었다. 이사벨라 버드 비숍의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에는 과도하게 따뜻하다고 적혀있는데, 방의 온도가 섭씨 39도를 넘어가 끔직한 밤을 보냈다고 한다.
온돌이 매우 더웠다는 평가를 내린 것은 이사벨라만이 아니었다. 아손 그렙스트는 그의 책<100년 전 한국을 가다>에서 “밤에는 펄펄 끓는 방바닥 위에서 빵처럼 구워지는 게 아주 습관이 되어 있었다”고 서술했다.
온돌의 장단점
온돌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과거 대부분의 집이 초가집이었던 것을 고려해보면 실내의 온기가 지붕의 짚단을 알맞은 온도를 만들어 각종 벌레의 온상으로 자리 잡는 데 일조했다. 노후화된 집에서는 단열이 잘 되지 않아 바닥은 따듯한데 공기는 차가운 일이 많아 효율적이지 못했다. 또한 산에 나무가 계속해서 줄어들었다.
단점에도 불구하고 온돌이 아직까지 쓰이는 이유는 그 장점 덕이다. 온돌은 바닥 위생에 발전을 가져다주었다. 바닥이 닦을 수 있는 장판으로 바뀌며 마루보다는 거 깨끗한 환경에서 누울 수 있게 됐다. 난방 효율 역시 좋아 한 번 데우면 열기가 오래 지속됐다. 지붕이나 연료의 문제역시 현대에 와서는 사라지게 됐으며, 계속된 기술 개발로 효율성이 높다는 장점이 더욱 부각되면서 한국인들과 떼려야 뗄 수 없게 됐다.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티비코리아의 이익보다 사업자의 이익을 먼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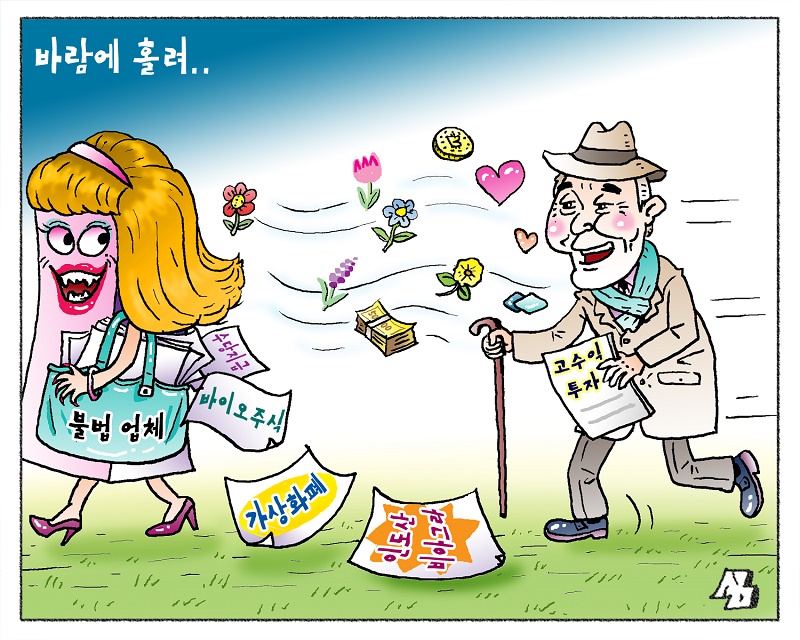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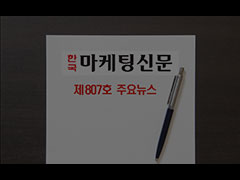 이곳을 클릭하면 더 많은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을 클릭하면 더 많은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